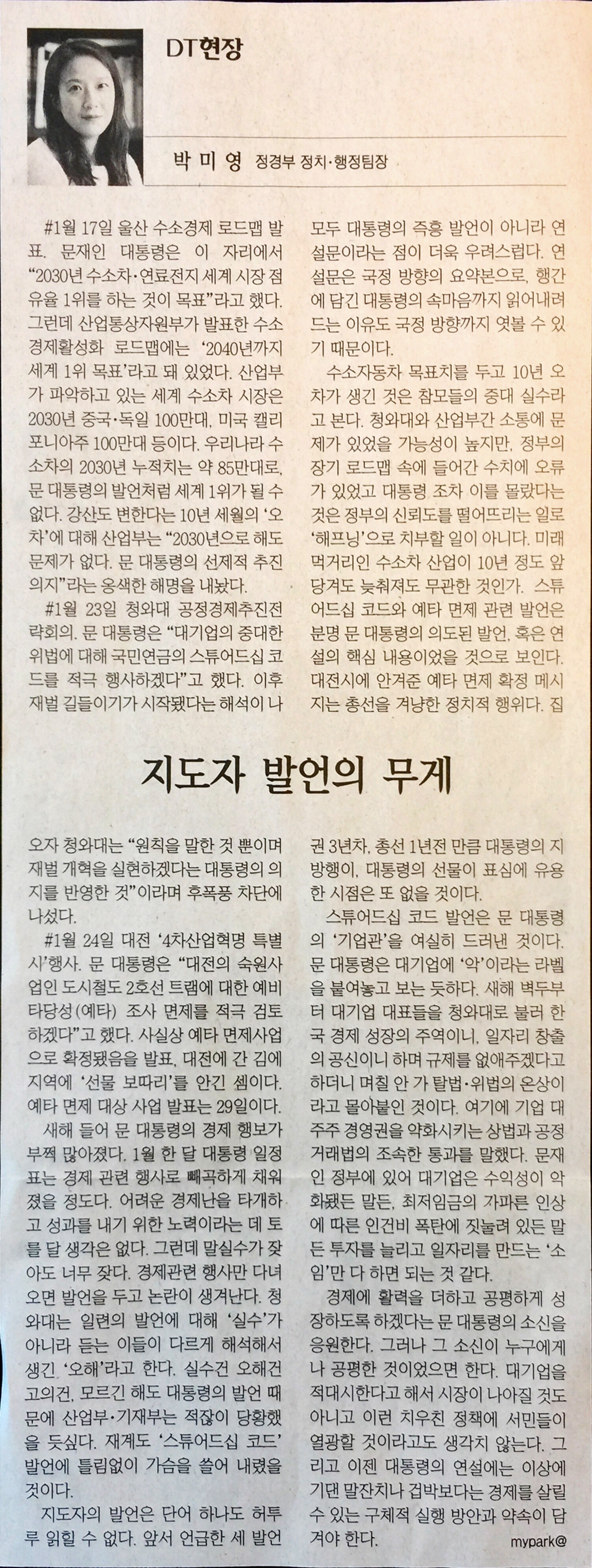지도자 발언의 무게
DT현장
박미영 정경부 정치·행정팀장
#1월 17일 울산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30년 수소차·연료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활성화 로드맵에는 ‘2040년까지 세계 1위 목표’라고 돼 있었다. 산업부가 파악하고 있는 세계 수소차 시장은 2030년 중국·독익 100만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100만대 등이다. 우리나라 수소차의 2030년 누적치는 약 85만대로,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세계 1위가 될 수 없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의 ‘오차’에 대해 산업부는 “2030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문 대통령의 선제적 추진 의지”라는 옹색한 해명을 내놨다.
#1월 23일 청와대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따”고 했다. 이후 재벌 길들이기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는 “원칙을 말한 것 뿐이며 재벌 개혁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후폭풍 차단에 나섰다.
#1월 24일 대전 ‘4차산업혁명 특별시’행사. 문 대통령은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됐음을 발표, 대전에 간 김에 지역에 ‘선물 보따리’를 안긴 셈이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 발표는 29일이다.
새해 들어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부쩍 많아졌따. 1월 한 달 대통령 일정표는 경제 관련 행사로 빼곡하게 채워졌을 정도다. 어려운 결제난을 타개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라는 데 토를 달 생각은 없다. 그런데 말실수가 잦아도 너무 낮다 경제관련 행사만 다녀오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생겨난다. 청와대는 일련의 발언에 대해 ‘실수’가 아니라 듣는 이들이 다르게 해석해서 생긴 ‘오해’라고 한다. 실수건 오해건 고의건, 모르긴 해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산업부·기재부는 적잖이 당황했을 듯싶다. 재계도 ‘스튜어드십 코드’ 발언에 틀림없이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이다.
지도자의 발언은 단어 하나도 허투로 읽힐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세 발언 모두 대통령의 즉헝 발언이 아니라 연설문이라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연설문은 국정 방향의 요약본으로, 행간에 담긴 대통령의 속마음까지 읽어내려드는 이유도 국정 방향까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소자동차 목표치를 두고 10년 오차가 생긴 것은 참모들의 중대 실수라고 본다. 청와대와 산업부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의 장기 로드맵 속에 들어간 수치에 오류가 있었고 대통령 조차 이를 몰랐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로 ‘해프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미래 먹거리인 수소차 산업이 10년 정도 앞당겨도 늦춰져도 무관한 것인가. 스튜어드십 코드와 예타 면제 관련 발언은 분명 문 대통령의 의도된 발언, 혹은 연설의 핵심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에 안겨준 예타 면제 확정 메시지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다. 집권 3년차, 총선 1년전 만큼 대통령의 지방행이, 대통령의 선물이 표심에 유용한 시점은 또 없을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언은 문 대통령의 ‘기업관’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에 ‘악’이라는 라벨을 붙여놓고 보는 듯 하다. 새해 벽두부터 대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니, 일자리 창출의 공신이니 하며 규제를 없애주겠다고 하더니 며칠 안 가 탈법·위법의 온상이라고 몰아붙인 것이다. 여기에 기업 대주주 경영권을 양화시키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조속한 통과를 말했따. 문재인 정부에 있어 대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됐든 말든,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인건비 폭탄에 짓눌려 있든 말든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소임’만 다 하면 되는 것 같다.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공평하게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소신을 응원하낟. 그러나 그 고신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었으면 한다. 대기업을 적대시한다고 해서 시장이 나아질 것도 아니고 이런 치우칭 정책에 서민들이 열광할 것이라고 생각치 않는다. 그리고 이젠 대통령의 연설에는 이상에 기댄 말잔치나 겁박보다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과 약속이 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