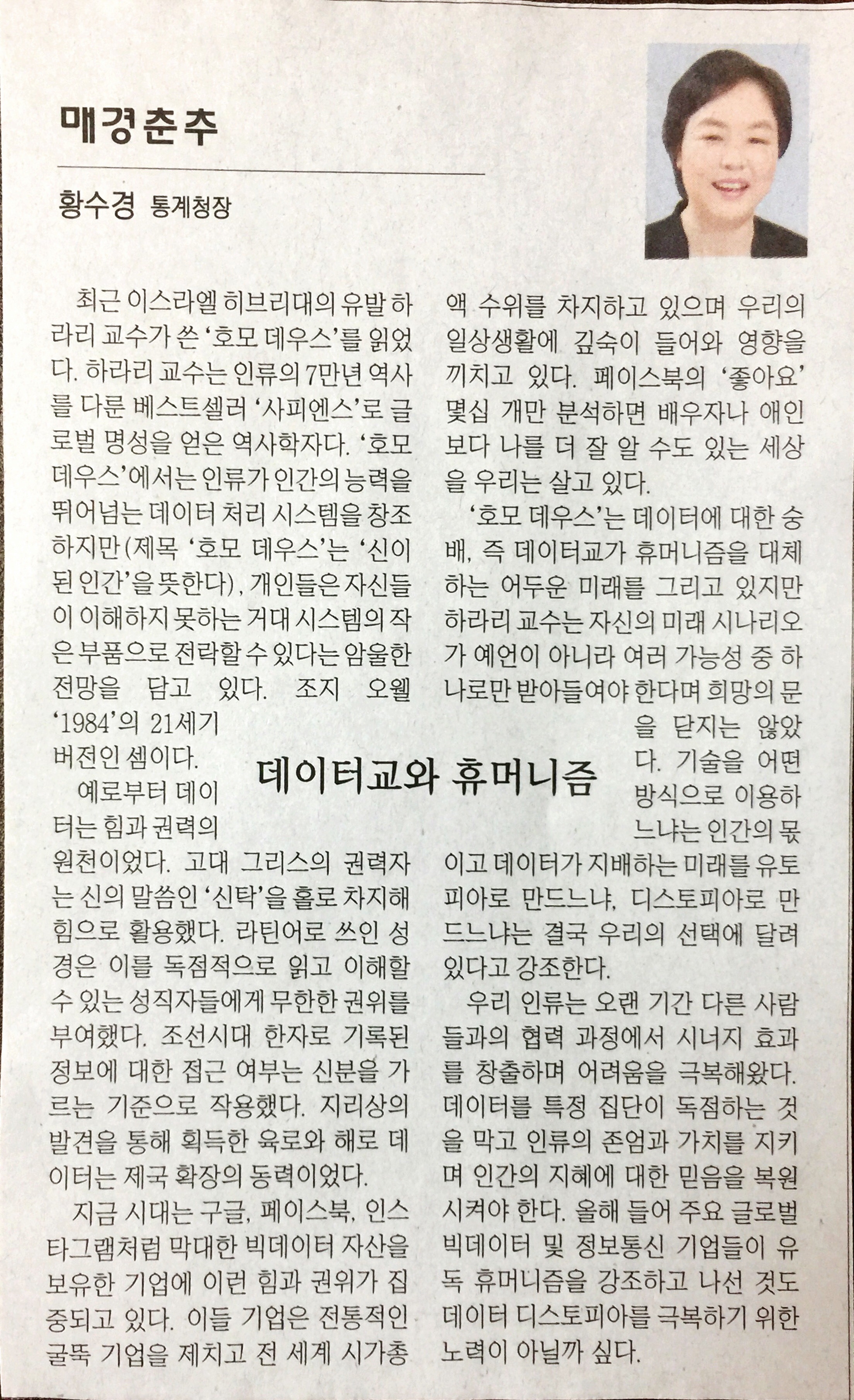데이터교와 휴머니즘
황수경 통계청장
최근 이스라엘 히브리대의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호모 데우스’를 읽었다. 하라리 교수는 인류의 7만년 역사를 다룬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로 글로벌 명성을 얻은 역사학자다. ‘호모 데우스’에서는 인류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창조하지만 (제목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을 뜻한다), 개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 시스템의 작은 부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담고 있다. 조지 오웰 ‘1984’의 21세기 버전인 셈이다.
예로부터 데이터는 힘과 권력의 원천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권력자는 신의 말씀인 ‘신탁’을 홀로 차지해 힘으로 활용했다. 라틴어로 쓰인 성경은 이를 독점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직자들에게 무한한 권위를 부여했다. 조선시대 한자로 기록된 정보에 대한 접근 여부는 신분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했다.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 획득한 육로와 해로 데이터는 제국 확장의 동력이었다.
지금 시대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막대한 빅데이터 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이런 힘과 권위가 집중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전통적인 굴뚝 기업을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몇십 개만 분석하면 배우자나 애인보다 나를 더 잘 알 수도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호모 데우스’ 데이터에 대한 숭배, 즉 데이터교가 휴머니즘을 대체하는 어두운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하라리 교수는 자신의 미래 시나리오가 예언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만 받아들여야 한다며 희망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느냐는 인간의 몫이고 데이터가 지배하는 미래를 유토피아로 만드느냐, 디스토피아로 만드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우리 인류는 오랜 기간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데이터를 특정 집단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 인류의 존업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복원시켜야 한다. 올해 들어 주요 글로벌 빅데이터 및 정보통신 기업들이 유독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데이터 디스토피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