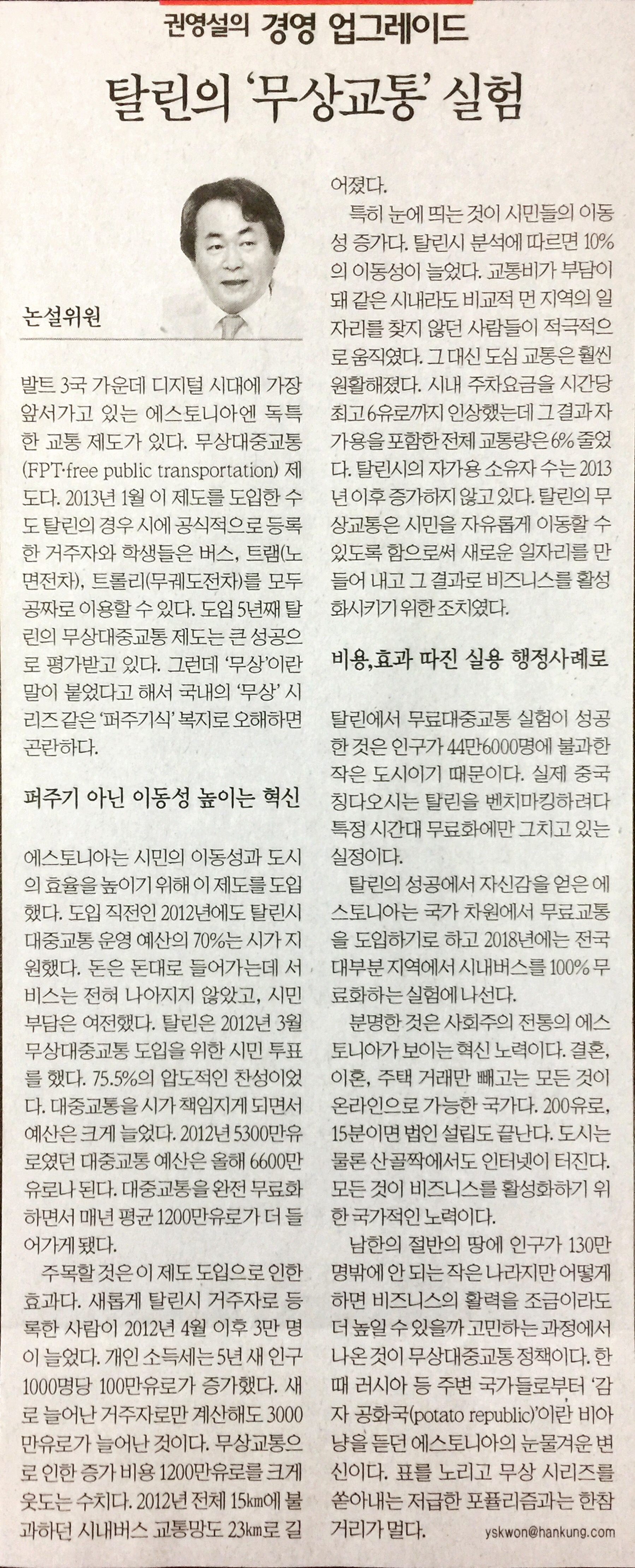탈린의 ‘무상교통’ 실험
권영설 논설위원
발트 3국 가운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에스토니아엔 독특한 교통 제도가 있다. 무상대중교통(FPT·free public transportation) 제도다. 2013년 1월 이 제도를 도입한 수도 탈린의 경우 시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거주자와 학생들은 버스, 트램(노면전차), 트롤리(무궤도전차)를 모두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도입 5년째 탈린의 무상대중교통 제도는 큰 성공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무상’이란 말이 붙었다고 해서 국내의 ‘무상’시리즈 같은 ‘퍼주기식’ 복지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퍼주기 아닌 이동성 높이는 혁신
에스토니아는 시민의 이동성과 도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직전인 2012년에도 탈린시 대중교통 운영 예산의 70%는 시가 지원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서비스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시민 부담은 여전했다. 탈린은 2012년 3월 무상대중교통 토입을 위한 시민 투표를 했다. 75.5%의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대중교통을 시가 책임지게 되면서 예산은 크게 늘었다. 2012년 5300만유로였던 대중교통 예산은 올해 6600만유로나 된다. 대중교통을 완전 무료화 하면서 매년 평균 1200만유로가 더 들어가게 됐다.
주목할 것은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다. 새롭게 탈린시 거주자로 등록한 사람이 2012년 4월 이후 3만 명이 늘었다. 개인 소득세는 5년 새 인구 1000명당 100만유로가 증가했다. 새로 늘어난 거주자로만 계산해도 3000만유로가 늘어난 것이다. 무상교통으로 인한 증가 비용 1200만유로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12년 전체 15Km에 불과하던 시내버스 교통망도 23Km로 길어졌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시민들의 이동성 증가다. 탈린시 분석에 따르면 10%의 이동성이 늘었다. 교통비가 부담이 돼 같은 시내라도 비교적 먼 지역의 일자리를 찾이 않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 대신 도심 교통은 훨씬 원할해졌다. 시내 주차요금을 시간당 최고 6유로까지 인상했는데 그 결과 자가용을 포함한 전체 교통량은 6%줄었다. 탈린시의 자가용 소유자는 2013년 이후 증가하지 않고 있다. 탈린의 무상교통은 시민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 결과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비용,효과 따진 실용 행정사례로
탈린에서 무료대중교통 실험이 성공한 것은 인구가 44만6000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칭다오시는 탈린을 벤치마킹하려다 특정 시간대 무료화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탈린의 성공에서 자신감을 얻은 에스토니아는 국가 차원에서 무료교통을 도입하기로 하고 2018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내버스를 100% 무료화하는 실험에 나선다.
분명한 것은 사회주의 전통의 에스토니아가 보이는 혁신 노력이다. 결혼, 이혼, 주택 거래만 빼고는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국가다. 200유로, 15분이면 법인 설립도 끝난다. 도시는 물론 산골짝에서도 인터넷이 터진다. 모든 것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다.
남한의 절반의 땅에 인구가 130만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의 활력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수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무상대중교통 정책이다. 한때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로부터 ‘감자 공화국(potato republic)’이란 비아냥을 듣던 에스토니아의 눈물겨운 변신이다. 표를 노리고 무상 시리즈를 쏟아내는 저급한 포퓰리즘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