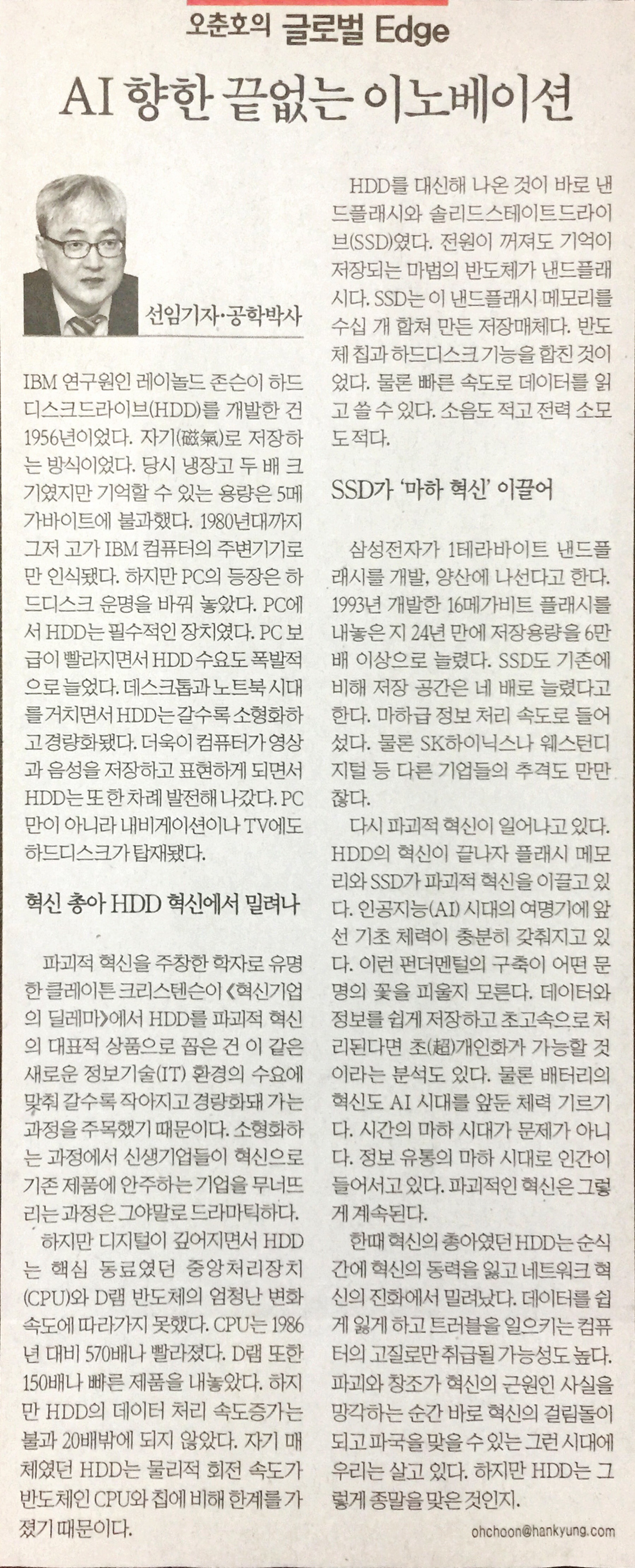AI향한 끝없는 이노베이션
오춘호 선임기자·공학박사
IBM연구원인 레이놀드 존슨이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개발한 건 1956년이었다. 자기(磁氣)로 저장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냉장고 두 배 크기였지만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은 5메가바이트에 불과했다. 1980년대까지 그저 고가 IBM컴퓨터의 주변기기로만 인식됐다. 하지만 PC의 등장은 하드디스크 운명을 바꿔 놓았다. PC에서 HDD는 필수적인 장치였다. PC보급이 빨라지면서 HDD는 갈수록 소형화하고 경량화 됐다. 더욱이 컴퓨터가 영상과 음성을 저장하고 표현하게 되면서 HDD는 또 한 차례 발전해 나갔다. PC만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나 TV에도 하드디스크가 탑재됐다.
혁신 총아 HDD 혁신에서 밀려나
파괴적 혁신을 주창한 학자로 유명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 <<혁신기업의 딜레마>>에서 HDD를 파괴적 혁신의 대표적 상품으로 꼽은 건 이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IT) 환경의 수요에 맞춰 갈수록 작아지고 경량화돼 가는 과정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소형화하는 과정에서 신생기업들이 혁신으로 기존 제품에 안주하는 기업을 무너뜨리는 과정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히다.
하지만 디지털이 깊어지면서 HDD는 핵심 동료였던 중앙처리장치(CPU)와 D램 반도체의 엄청난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했다. CPU는 1986년 대비 570배나 빨라졌다. D램 또한 150배나 빠른 제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HDD의 데이터 처리 속도증가는 불과 20배밖에 되지 않았다. 자기 매체였던 HDD는 물리적 회전 속도가 반도체인 CPU와 칩에 비해 한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HDD를 대신해 나온 것이 바로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였다. 전원이 꺼져도 기억이 저장되는 마법의 반도체가 낸드플래시다. SSD는 이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수십 개 합쳐 만든 저장매체다. 반도체 칩과 하드디스크 기능을 합친 것이었다. 물론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다. 소음도 적고 전력 소모도 적다.
SSD가 ‘마하 혁신’ 이끌어
삼성전자가 1테라바이트 낸드플래시를 개발, 양산에 나선다고 한다. 1993년 개발한 16메가비트 플래시를 내놓은지 24년 만에 저장용량을 6만배 이상으로 늘렸다. SSD도 기존에 비해 저장 공간은 네 배로 늘렸다고 한다. 마하급 정보 처리 속도로 들어섰다. 물론 SK하이닉스나 웨스턴디지털 등 다른 기업들의 추격도 만만찮다.
다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HDD의 혁신이 끝나자 플래시 메모리와 SSD가 파괴적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여명기에 앞선 기초 체력이 충분이 갖춰지고 있다. 이런 펀더멘털의 구축이 어떤 문명의 꽃을 피울지 모른다. 데이터와 정보를 쉽게 저장하고 초고속으로 처리된다면 초(超)개인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론 배터리의 혁신도 AI시대를 앞둔 체력 기르기다. 시간의 마하 시대가 문제가 아니다. 정보 유통의 마하 시대로 인간이 들어서고 있다. 파괴적인 혁신은 그렇게 계속된다.
한때 혁신의 총아였던 HDD는 순식간에 혁신의 동력을 읽고 네트워크 혁신의 진화에서 밀려났다. 데이터를 쉽게 잃게 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컴퓨터의 고질로만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파괴와 창조가 혁신의 근원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바로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파국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지만 HDD는 그렇게 종말을 맞은 것인지.